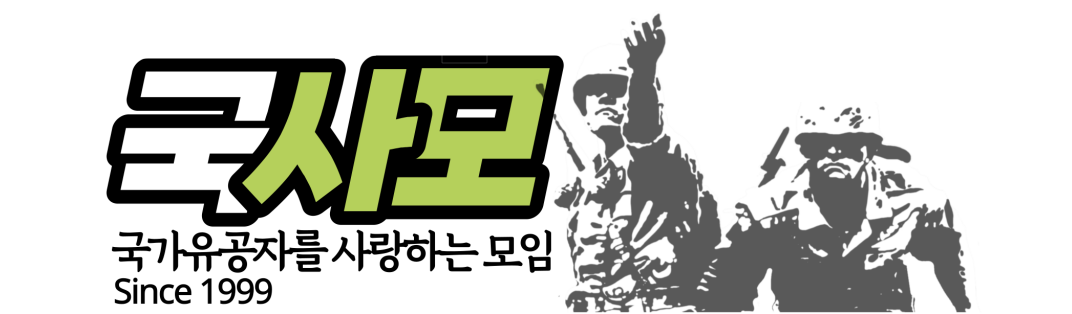자유게시판
[독자제보 ➁] 6·25 참전 고통은 사실인데...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민수짱
0
691
09.02 16:15
[독자제보 ➁] 6·25 참전 고통은 사실인데...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군수물자조차 보급되지 못한 전장의 특수성 고려해야”
전문의 자문 결과 토대로 법정에서 싸울 것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
입력 2025.09.02 08:53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6·25 전쟁 당시 참전 과정에서 간농양을 앓고 이후 시력 저하까지 겪은 한 참전용사의 사례가 확인됐지만,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사유로는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투 참여와 질병 발생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이 정한 ‘전상(戰傷)과 공상(公傷)’ 요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참전·질병은 인정... 국가유공자 지정은 불가.
<충남일보 8월 12일자 5면 보도>에 따르면 보훈당국은 “해당 참전용사가 전투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참전 중 간농양을 앓았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간농양은 적의 무기나 폭발물로 인한 전상이나 군 복무 과정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공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투 중 상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또는 직무와 명백히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만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감염성 질환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군 관계자 “보급조차 막힌 상황, 참작해야”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한 군 관계자는 “직접적인 전투와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질환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군수물자 보급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전시 환경에서 영양 결핍과 위생 악화로 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전시 특수성에 따른 피해로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의 괴리.
의학 전문가들 역시 첨부된 소견서에서 “간농양은 분명히 전투 중 열악한 위생 환경과 영양 결핍 등으로 촉발될 수 있으며, 시력 상실 같은 중대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외 사례에서도 간농양이 내인성 안내염으로 진행해 실명에 이른 경우가 다수 보고됐다. 하지만 법적 해석은 여전히 엄격했다.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전투 환경과 맞닿아 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는 이를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적 사실과 법적 요건 사이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물음.
이번 사례는 보훈제도의 선별적 인정 구조를 드러낸다. 전투 참여와 희생은 명백하지만, 법적 해석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당사자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큰 상실감을 안긴다.
“국가유공자 지정은 법령과 기준의 문제”라는 정부 입장과 “전투 참여 자체로 이미 희생이 입증된 것 아니냐”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맞서고 있다. 참전의 가치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제도의 경직성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갈등.
유족 측은 전문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 불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투 상황에서 발생한 질병이 단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국가보훈 제도의 해석 범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충남일보 :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106
“군수물자조차 보급되지 못한 전장의 특수성 고려해야”
전문의 자문 결과 토대로 법정에서 싸울 것
김현수 기자 tims@hanmail.net
입력 2025.09.02 08:53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6·25 전쟁 당시 참전 과정에서 간농양을 앓고 이후 시력 저하까지 겪은 한 참전용사의 사례가 확인됐지만,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사유로는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투 참여와 질병 발생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이 정한 ‘전상(戰傷)과 공상(公傷)’ 요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참전·질병은 인정... 국가유공자 지정은 불가.
<충남일보 8월 12일자 5면 보도>에 따르면 보훈당국은 “해당 참전용사가 전투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참전 중 간농양을 앓았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간농양은 적의 무기나 폭발물로 인한 전상이나 군 복무 과정의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공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투 중 상이,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또는 직무와 명백히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만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감염성 질환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해석이다.
-군 관계자 “보급조차 막힌 상황, 참작해야”
그러나 군 내부에서는 다른 시각도 제기된다. 한 군 관계자는 “직접적인 전투와 무관하게 발생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질환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군수물자 보급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전시 환경에서 영양 결핍과 위생 악화로 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전시 특수성에 따른 피해로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의 괴리.
의학 전문가들 역시 첨부된 소견서에서 “간농양은 분명히 전투 중 열악한 위생 환경과 영양 결핍 등으로 촉발될 수 있으며, 시력 상실 같은 중대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외 사례에서도 간농양이 내인성 안내염으로 진행해 실명에 이른 경우가 다수 보고됐다. 하지만 법적 해석은 여전히 엄격했다. 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전투 환경과 맞닿아 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는 이를 국가유공자의 범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적 사실과 법적 요건 사이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한계와 사회적 물음.
이번 사례는 보훈제도의 선별적 인정 구조를 드러낸다. 전투 참여와 희생은 명백하지만, 법적 해석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당사자뿐 아니라 유족에게도 큰 상실감을 안긴다.
“국가유공자 지정은 법령과 기준의 문제”라는 정부 입장과 “전투 참여 자체로 이미 희생이 입증된 것 아니냐”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맞서고 있다. 참전의 가치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제도의 경직성을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갈등.
유족 측은 전문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지정 불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투 상황에서 발생한 질병이 단순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국가보훈 제도의 해석 범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지 주목된다.
출처 충남일보 :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7106